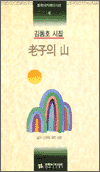상세정보

바다를 노래하고 싶을 때
- 저자
- 김기우
- 출판사
- 문학아카데미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01-12-1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관계의 늪에서 유목민적 주체의 세계로
저물어 가는 20세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기말적인 증후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난 <바다를 노래하고 싶을 때>에서 불빛을 발견한다. 그 불빛은 희미하여 잘 보이지는 않지만 텍스트에 깊어 들어갈수록 선연히 드러난다. 나는 어둠의 공포를 잊고 점점 텍스트에 빠져들어간다.
그런 나에게 텍스트의 음악적 분위기나 악보를 설명할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설에서 생산하는 미적 기운을 붙잡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어쩌면 그것이 '계시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석하는 자의 냉정해야 할 태도가 자꾸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