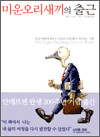황주리 에세이 - 날씨가 너무 좋아요
- 저자
- 황주리
- 출판사
- 생각의나무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01-12-1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고독해도 살아있으니까 좋아요.'
서양화가 황주리의 삶과 그림이야기. '삶과 그림' 사이에 '고독'을 끼워도 좋을 만큼 <날씨가 너무 좋아요>는 잔뜩 흐려있는 책이다. 목소리만 듣고 끊는 전화가 몇 달째 걸러온다. 이를 수상쩍어 하다가도 막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그녀는 가끔 그 전화를 기다렸다. 이 정도면 고독도 이만저만한 고독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살면서 들었던 생각과 감상을 자신의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아득바득 살아갔던 나날들, 될 수 있으면 신사적인 인간 관계만을 선택했던 지난날, 고궁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일년을 보낸 처량한 날의 기록이 덩그랗게 남아 있다.
지금부터 한 40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여든이 되는 해에 자살하겠다고 소녀 같은 말을 늘어놓는 그녀는 올해로 마흔 셋. 아직 젊기만 한데 그녀는 유독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죽는 일을 빼면 이 세상에 큰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적당한 때에 아무 고통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을 죽여준다면, 그는 정말 은인이지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요절한 천재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야의 화려했으나 짧았던 생을 한탄한다.
그런 어느 날은 유서를 쓴다고 심통을 부리다가 '갑자기 살고 싶어졌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사랑스럽고, 밤중에 출출한 뱃속을 채우느라 괜히 한번 열어본 빈 냄비 속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사랑스러웠다'고 불쑥 고백한다.
고독할 대로 고독한 그녀의 글을 읽는 동안 눈에 걸리는 것은 '자화상'과 '두 사람' 연작.
3~4 쪽에 한번 꼴로 같은 제목의 완전히 다른 그림이 자리를 잡았다. 사람의 형상인가 하면 곧 새와 물고기의 중간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버리는, 혹은 우두커니 사색에 잠기거나 눈을 감고 고요히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자화상'들.
그와는 달리 '두 사람'은 얼굴 없는 두 사람 - 설사 얼굴이 있다해도 표정이 절제되어 있는 - 을 등장시켜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게 한다. '두 사람' 그림에서는 따뜻한 빛이 흘러나온다. 둘 사이의 스킨쉽은 언제나 강조되어 있지만, 정적이 느껴질 정도로 단조로운 윤곽선은 '자화상'에서 보던 것 그대로다.
이렇게 잠깐 그림에 빠졌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와 보면, 그림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닐까 싶다. 설사 그렇다 해도 별 탈은 없다. 글은 쓰고, 그림은 그렸을 뿐이지 그녀가 살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한가지일 터이기 때문이다.
2001년 6월 2주 주간 베스트셀러 종합 18위
2001년 6월 2주 주간 베스트셀러 비소설 7위
2001년 6월 1주 주간 베스트셀러 비소설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