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 저자
- 김승섭 저
- 출판사
- 동아시아
- 출판일
- 2023-07-13
- 등록일
- 2023-10-3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6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교수 기획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K-방역의 그늘에서 재난의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은 누구였던가?여섯 연구자가 기록한 팬데믹 속 차별의 시간전 세계 최저 수준의 사망률, 시민의 참여가 만든 K-방역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발한 지는 3년 반,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2020년 1월 30일로부터는 약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고통과 슬픔, 비극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국은 빠른 초기대응과 확진자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낸 것으로 호평받았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이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팬데믹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 20개국을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한 결과, 한국은 코로나19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과 치명률(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 어느 쪽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은 페루는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누구도 이 성과를 폄하할 수는 없다. 한국은 3년이 넘는 기간 내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이 한데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던 성과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금, 우리는 지난 성공을 자축하는 것으로 이 재난을 마감해버리면 되는 것일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우리 몸이 세계라면』 등 개인적인 저술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천착해 왔던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질문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지난 3년의 시간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라고."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지난 3년의 시간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한 방식의 기억은 지난 3년 동안 각자의 사회적 자리에서 팬데믹을 차별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위험을 가장 먼저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김승섭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각자 다른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다섯 명의 연구자들을 모았다.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다. 이들은 재난이 덮쳐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들이 겪고 있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난을 만나는 순간,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부는 상층에 집중되고, 위험은 하층에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으나,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공의 실험실 속에서 바이러스와 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마주했던 팬데믹의 모습은 정말 모두 같았을까? 김승섭 교수를 위시한 여섯 연구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묻고, 다시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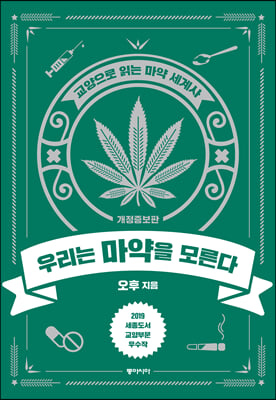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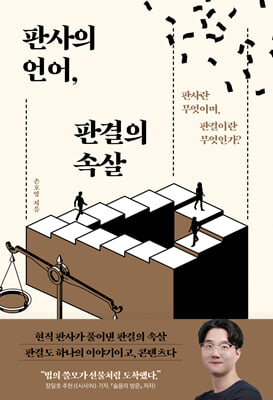


![[단독]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images/bookimg/5318631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