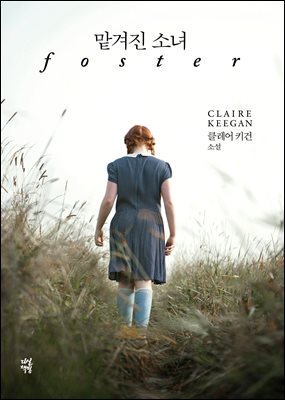미술관에 간 화학자
- 저자
- 전창림
- 출판사
- 랜덤하우스코리아
- 출판일
- 2009-12-21
- 등록일
- 2011-04-1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불후의 명화가 진화해온 화학적 우여곡절
미술의 역사를 바꾼 그림 속 화학 이야기
미술은 화학에서 태어나 화학을 먹고 사는 예술이다
이 책의 저자는 화학자다. ‘화학자가 웬 미술?’이라고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술은 화학에서 태어나 화학을 먹고사는 예술이다. 그림의 표현 매체인 물감이 다름 아닌 ‘화학 물질’인 까닭이다. 또한 캔버스의 물감이 마르고 발색하고 퇴색하는 모든 과정은 ‘화학 작용’이다. 즉, 미술의 매체가 되는 물감이 제조되고, 쓰이고, 보존되는 과정 모두가 화학인 셈이다.
그러나 명화를 그렸던 화가들조차 자신들의 그림이 화학 작용의 갖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진화(!)해온 화학의 소산임을 알지 못했다. 실제로 헬리콥터를 구상해 설계도를 그렸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인체해부도를 남겼을 정도로 과학에도 천부적인 소양을 갖췄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조차 화학만큼은 문외한이었다. 미술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최후의 만찬>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것은, 다 빈치가 물감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세 고딕미술에서부터 유화를 창시했던 근대미술과 햇빛에서 색을 분석해냈던 인상파 미술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화학으로 인해 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진화하고 퇴화해 왔는지를 명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어 하나하나 풀어낸다.
화학이 미술의 태생적 연원임을 밝힌 최초의 책
명화에 관한 미술사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에서부터 화가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미술 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미술의 태생적 연원이 되는 화학을 통해서 명화를 조명한 책은 그동안 출간된 적이 없었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나 중세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의 화가들조차 화학을 통해 그림을 해석하거나 창작 과정에서 화학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을 무시한 그림은 퇴색하고 변색하여 화가가 의도했던 원래의 예술적 가치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은 미술의 태생적 연원이 화학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화학으로 인해 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힌 최초의 책이다.
화학을 모나리자만큼 친숙하게 만드는 미술의 힘
화학은 일반인에게는 물론, 과학자에게도 어려운 학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의 세계를 어려운 공식을 들어 설명하는 화학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보면 모나리자만큼이나 화학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의 연구 대상을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구현해 내는 미술의 힘이기도 하다.
미술의 태생적 연원이 화학에서 비롯되었다면, 화학을 과학의 카테고리에서 꺼내 예술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다름 아닌 미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