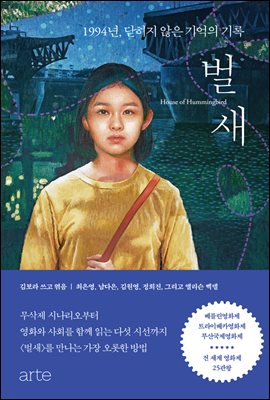.jpg)
말러
- 저자
- 노승림 저
- 출판사
- arte(아르테)
- 출판일
- 2023-03-07
- 등록일
- 2023-06-1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16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삶, 그 속되고 아름다운 것을 모두 포용한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예술 공간 말러 음악의 음향적 원천이 된 이흘라바에서부터음악 인생의 정점을 찍은 빈을 거쳐 마지막 예술혼을 사른 뉴욕에 이르기까지 말러의 삶과 예술 공간을 찾아가다 “그는 만물 안에서 살았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살았다.”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그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하기도 한 명지휘자 브루노 발터의 이 말처럼 말러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귀한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두루 포용한 음악 세계를 보여 주었다. 교향곡은 세계와 같아야 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말러 자신의 말처럼 그가 만든 열 개의 교향곡은 분열되고 파편화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베토벤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맛의 웅장한 서사와 깊은 여운을 선사한다. 말러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말러를 포함하여 열네 명의 형제자매들 중 절반은 어린 나이에 사망했을 만큼 죽음은 늘 그의 가족 가까이에서 어른거렸다. 아래층 선술집에서 흥겨운 유행가 가락이 들려올 때, 말러의 가족이 거처한 2층 침실에서는 병에 걸린 아이의 숨이 꺼져 가고 있었을 것이다. 훗날 그의 음악에 세속적인 소리와 자연의 소리가 풍부하게 용해되어 있고,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공존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이런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평생 죽음이라는 주제에 강박적으로 매달렸다. 이에 생애 처음 작곡한 첫 번째 교향곡에 대해 “내 교향곡의 영웅은 무덤가에서 태어난다”라고 공언했으며, 말년에 작곡한 교향곡 9번에 대해서는 “죽음이 내게 들려준 것”이라 표현했다. 이렇듯 지휘와 작곡을 넘나들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나는 삼중으로 고향이 없는 사람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헤미아인으로,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오스트리아인으로, 세계에서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나 이방인이고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한 그의 말처럼 그에게는 소외된 자의 고독이 운명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바로 그랬기 때문에, 즉 평생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도 기울지도 않은 채 어떤 경계에서 자기만의 외길을 걸어갔기에 그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 주면서 현대음악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그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말러리안이라 불리는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저자인 음악 칼럼니스트 노승림은 말러가 묻혀 있는 그린칭 묘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유소년기를 보낸 이흘라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빈, 그의 첫 번째 작곡 오두막이 있는 아테르제 호수, 두 번째 작곡 오두막이 있는 마이에르니히, 세 번째 작곡 오두막이 있는 토블라흐, 마지막 예술혼을 사른 뉴욕에 이르기까지 거장의 예술 공간을 따라가며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린칭 묘지에서는 말러가 평생 동안 매달린 죽음이라는 주제를 사색했고, 빈에서는 그가 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어떻게 분투해 갔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세 개의 작곡 오두막에서는 자연이 그의 음악에 어떻게 용해되어 들어갔는지를 실감했으며, 생의 마지막을 보낸 뉴욕에서는 유랑하는 마에스트로 말러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말러 여행을 마치며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라본 말러의 인생은 고난을 이긴 성공 스토리와 거리가 멀며, 그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책이나 음악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만난 말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떠돌던 파우스트와 같은 방랑자다. 부귀영화나 세속적인 명예는 그의 마음을 채워 줄 수 없었다. 인간이 저마다 안고 태어나는 인생의 고난은 극복이 아닌 포용하고 초월할 대상임을 삶은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도 이것이다.”